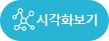| 항목 ID | GC09000016 |
|---|---|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시대 | 고대/삼국 시대/백제 |
| 집필자 | 이용현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발견된 글을 적은 나뭇조각에 나타난 고대 부여인의 삶.
[개설]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백제 목간은 2023년 현재 16개 유적에서 102점 125편이 출토되었다. 이는 전체 백제 목간의 거의 95%를 차지한다. 목간은 단편적 내용을 기록하여 정보량이 많지 않지만, 당대인이 기록한 자료로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같은 문헌에서는 전하지 않는 상세한 당대 자료를 전한다.
[사비도성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목간]
1. 목간의 보고 쌍북리 유적
쌍북리(雙北里) 유적은 사비도성 내에 있는 금성산(錦城山)의 북동사면에 있다. 쌍북리 유적이 있는 곳은 사비 시대에 도성의 중심 지역과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 지역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 알려져 있다. 쌍북리 유적 북쪽 인근의 부여 나성과 청산성(靑山城)이 만나는 곳에는 부여 나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월함지(月含池)라는 저수지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청산성에서 유적을 포함한 주변 일대까지 광범위하게 저습지가 형성되었고 현재는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 지역 일대에서는 전체적으로 11건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쌍북리 102번지 일대 유적에서는 칠기를 비롯한 다양한 목제품과 ‘월20(月卄)·사(舍)·대(大)’가 새겨진 백제 시대 명문 토기 조각과 함께 목간 2점, 눈금 간격이 약 1.5㎝ 정도 되는 목제 자[尺]가 수습되었다. 또 뒷개 유적 조사를 통하여 막대형의 4면 목간 등이 확인되었다. 쌍북리 56번지 일원 사비 한옥 마을 부지 조사에서 정사년(丁巳年)기년 목간과 논어 목간 등 총 17점의 목간이 출토되었으며, 사비기 후반의 도성 모습을 알려 주는 건물지·화장실·우물·공방지 등 생활 유구가 발견되었다.
2. 백제의 진대법 좌관대식기
좌관대식기(佐官貸食記) 목간은 제1건물지 동쪽 1.7m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목간에 적힌 무인년(戊寅年)은 618년이다. 중앙 관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곡물을 춘궁기에 관의 식량을 백성에게 빌려주고 추수기에 이자 50%와 함께 회수하였던 대식제를 운영하고 있었음을 기록하여, 고리대 운용의 실상, 관아 운영의 일면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회 경제 사료다. 일찍이 고구려에 진대법이 있었는데, 운영 원리에서 대식제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 대식이란 용어는 7세기 일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기금 운영 제도가 고구려에서 백제로, 다시 일본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목간을 통하여 고대 동아시아에서 문화와 제도의 영향과 교류를 볼 수 있다.
3. 백제와 왜의 물적 증거 ‘나니와’와 ‘무리지’
백제는 일본과 전통적으로 친밀하고 우호적인 교류 관계에 있었다. 목간에서도 백제와 왜의 교류를 전하는 자료가 있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에서 ‘나니와[那尒波]’와 ‘무라지[連]’라고 쓰인 목간이 발견되었다. 나니와[那尒波]는 ‘난바[難破]’라고도 쓰며 일본 오사카[大阪] 지역의 옛 이름이다. 무라지는 일본 고대의 카바네[姓]로서, 유력 귀족이 소지하였다. ‘나니와’와 ‘무라지’라고 적힌 목간은 홈이 파인 꼬리표인데, 아마도 왜(倭)에서 백제 사신으로 온 고위 관료의 물품에 부착된 것으로 보여, 왜의 고위직이 백제 왕경 부여에 체제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목간이다.
4. 논어와 구구단 교육 목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6번지 사비 한옥 마을 조성 부지 유적 회색 점질층에서는 논어 목간이 출토되었다. 4면 목간으로, 목간의 내용은 『논어』 학이편 제1장과 제2장의 일부다. 『논어』는 국내에서 한문과 유교 지식을 배우는 경전으로 중시되었는데, 백제 왕경의 지식인과 관리들이 『논어』 학습에 열중했음을 알려준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8-2번지 단독 주택 신축 부지 유적에서는 구구단 목간이 출토되었다. 구구표 목간은 9단에서 시작하여 2단까지 좌서(左書)로 기록되었다. 각 단 사이는 횡선을 한 줄씩 그어 구획하였으며, 반복 부호인 ‘’를 활용하였다. 구구단은 계산에 필요한 기본 셈식으로 장부의 수치는 물론 건축 관련 계산 등 다방면에 요긴한 것이었다. 아마도 백제의 관료들이 품 안에 휴대하면서 업무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백제 멸망기 아픔을 간직한 목간
백제 멸망기 상황을 알려 주는 목간들도 있다. 관북리 관아 혹은 왕궁지에서 출토된 ‘우이(嵎夷)’ 낙인(烙印) 목간과 병여(兵与) 목간들이 그것들이다. ‘우이’는 부여융이 관할했던 웅진도독부 산하 13개 현 중 하나인 우이현(嵎夷縣)이며, 백제를 침공한 나당 연합군 중 김춘추나 유백영이 이끌던 군단 명칭 속에도 ‘우이도행군총관(嵎夷道行軍總管)’이 보인다. 즉 이는 백제 멸망기와 웅진도독부 시기의 자료로 보인다. ‘우이’ 낙인 목간은 관련된 물건의 꼬리표거나 관청 출입용 신부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기나 군대를 수여한다는 의미의 병여 목간은 “2월11일에 조(詔)를 내려 무기나 군대를 수여하였다”라는 기록이다. 두 목간은 백제 멸망 전후 격렬하고 긴박하였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주변 왕궁 및 관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6. 선비의 취직 운동 구아리 목간
부여 시외버스 터미널 남쪽인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19번지 성결교회 유적에서 백제 도성 5부인 하부(下部), 중부(中部), 전부(前部)와 관등인 내솔(柰率), 인명인 득진(得進)의 묵서흔이 남은 목간 등 13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벼슬 청탁과 관련된 서간이 담긴 목간인데, 벼슬에 굶주린 가난한 선비의 처절한 취직 운동의 심정과 호소를 절절하게 전한다. 목간의 내용은 “보내주신 편지가 왔습니다. 삼가 이렇게 가난한 곳에서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벼슬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때가 전혀 없으니, 음덕을 입은 후라면, 영원토록 잊지 않겠나이다”로 호소력 있는 매우 훌륭한 문장을 구사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문필을 보여 준다. 『주서』 백제전에 백제가 문장과 업무에 능하다고 평하였는데, 이를 잘 보여 주는 관료 지식인의 모습이다.
[부왕을 잃은 슬픔을 간직한 능산리 사지 목간]
부여 능산리 사지는 사비 시대의 사찰 유적이다.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는 30여 점의 백제 시대 목간이 출토되었다. 주로 서배수로 인접 구역에서 노출된 V자형 남북 방향 도랑 내부와 제2 배수 시설에서 출토되었다. 목간 부스러기도 200여 편 출토되었는데, 목간의 잘못 쓴 글자를 정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묵서를 삭도로 깎은 삭편(削片)이다. 목간에는 종래 문헌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보희사(寶憙寺)·자기사(子基寺) 등의 백제 사찰과, 대승(大升)·소승(小升) 등의 백제 도량형제, 그리고 백제의 관료제와 문서 행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4면에 “의를 받들지 않겠는가. 길 가에 세워라”라고 적힌 남근형 목간도 발견되었다. 이는 불교 사찰에서 도교 혹은 토착 신앙까지 포섭한 모습을 보여 주는데, 백제가 수용한 남조 양나라의 불교와 맞닿는다. 시가 목간도 보이는데 “숙세에 업을 맺어, 한곳에서 태어났으니, 이는 서로 여쭈어 아뢸 일이 아니다”라는 시가 적혀 있다. 불교 지식을 가진 이가 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형제자매간을 읊은 것으로, 불교적 세계관이 사회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약아(藥兒)와 도사(道使)에게 식미(食米)를 지급한 사실을 기록한 장부 목간인 지약아식미기(支藥兒食米記)도 발견되었다.
[사비도성의 남원 궁남지 일원 출토 목간]
부여 궁남지 유적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번지 일대에 있는 백제 사비 시기의 궁원지(宮苑池) 유적이다. 634년(무왕 35)에 궁남지(宮南池)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궁남지의 동쪽 일대는 화지산(花枝山)을 배경으로 건설된 사비 시대의 별궁지(別宮址)로 전해지고 있다. 인근에 대리석을 팔각형으로 짜 올린 어정(御井)이라 불리는 유구나 백제의 기와 조각, 초석 등이 남아 있다. 궁남지의 인공 수로와 목조 저수조에 퇴적된 개흙층에서 목간 3점이 출토되었다. 3덤의 목간 가운데 수려한 서체로 쓰여진 문서 목간에는 앞면과 뒷면에 특정 지역의 인구 수와 관련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기록한 약 30자가 적혀 있었다. 백성들은 사비 도성의 행정 구역인 ‘오부오항제(五部五巷制)’에 편제되어 있었고, 남녀별 또는 연령별로 분류 기록되었다. 인구를 정(丁), 중(中), 소(小)와 같이 기록하고 있고, 부인(婦人) 등 가족 관계도 기재하고 있어서 남녀별, 연령별로 세밀한 인구 관리와 함께 호적제가 가동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 각 정이나 가호(家戶)의 인적 구성, 보유한 토지가 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목간에서는 지역명, 수전(水田)과 그 토지 단위 면적 기록 가운데 형(形)이라는 백제 특유의 단위가 보인다. 왕경 소속 백성의 소유 내지 경작 토지는 왕경을 넘어 매라성(邁羅城) 같은 지방도 망라하고 있었다. 논에 대해 신라에서는 ‘답(畓)’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비해, 백제에서는 ‘수전(水田)’으로 표기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법리원(法利源)’의 ’법리‘란 불교 용어인데, 토지 개간과 함께 새로 확보된 토지 구역 명명에 관료의 불교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다. 이 밖에도 궁남지에서는 “금경백(今敬白)”, 즉 “지금 삼가 아뢰기를”이란 문구가 들어 있는 보고용 문서 목간과 함께, 사면에 ‘문(文)’과 ‘야(也)’라는 글자를 여러 번 쓴 연습한 목간도 발견되었다.
궁남지와 화지산을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2-9번지에서 5점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목간 가운데는 금(金)의 출납을 기록한 문서 목간이 있다. 무령왕릉이나 부여 왕흥사지와 부여 능산리 사지,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화려하고 정교한 금과 은 제품들이 출토되었는데, 국가와 왕실이 경영하는 전용 공방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금의 관리가 아주 엄격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금 출납 목간이 보여 준다. 한편 금의 중량 단위로서 양(兩)과 주(主)가 보인다. 각각 익산 미륵사지 은판과 공주 무령왕릉 왕비팔찌에서 보이는데, 주(主)는 중(重)의 이체자설도 제기되고 있다. 금 출납 목간과 함께 ‘피[稗]’의 지급을 기록한 목간도 발견되었다. 피가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에서도 백성들의 기본 식량이었음을 알려 준다. 또한 지급 수량이 5되[斗]여서 이것이 기본 보수의 단위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 이용현, 『한국 목간 기초 연구』(신서원, 2002)
- 홍승우, 「〈좌좌관화식기〉에 나타난 백제의 양제와 화식제」(『목간과 문자』4, 한국목간학회, 2009)
- 손환일, 「백제 목간 〈지약아식미기〉와 〈좌관대식기〉의 문체와 서체」(『신라사학보』18, 신라사학회, 2010)
- 전덕재, 「한국의 고대 목간과 연구 동향」(『목간과 문자』9, 한국목간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