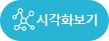| 항목 ID | GC09001375 |
|---|---|
| 영어공식명칭 | Religious Rituals for a Well and Village Fire in Munsin-ri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의례/제 |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문신리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박종익 |
| 의례 장소 | 대동 샘 -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문신리
|
|---|---|
| 성격 | 민간 의례|마을 제사 |
| 의례 시기/일시 | 음력 1월 14일 |
| 신당/신체 | 대동 샘|동화대 |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문신리에서 해마다 정월 열나흗날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내는 마을 제사.
[개설]
문신리 샘제·동화제(文臣里 샘祭·洞火祭)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문신리 구신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정월 열나흗날 저녁 무렵에 마을의 공동 우물과 동화(洞火)를 대상으로 지내는 의례이다. 샘제는 공동 우물에 물이 잘 나오라고 비는 의례이며, 동화제는 동화를 불사름으로써 마을에 깃든 모든 액운을 깨끗이 씻고자 하는 의례이다. 동화란 ‘동네 불’을 뜻하는데, 땔나무를 동아줄로 묶어 하늘을 향하여 곧추세운 나뭇더미를 가리킨다.
[연원 및 변천]
문신리 샘제·동화제의 유래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샘제를 지내는 공동 우물 앞에 세워진 유래비에 따르면 17세기 말부터 샘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신당/신체의 형태]
샘제를 지내는 공동 우물은 길이 2.5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에 깊이는 3m에 이른다. 우물 주위는 난간으로 둘러 사람이 빠지지 않게 하였다.
[절차]
정월대보름 전날인 정월 열나흗날 해 질 무렵이 되면, 화주의 집과 대동 샘을 잇는 길에 황토를 뿌리고 샘제와 동화제 준비를 마친다. 제관인 화주(化主)는 대동 샘 앞에 돗자리를 펴고 제물을 차린다. 샘제는 먼저 화주가 동서남북을 향하여 차례로 절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절을 마치면 소지 석 장을 올린다. 첫 번째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솟아나기를 축원하는 유왕[용왕] 소지, 두 번째는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대동 소지, 세 번째는 샘제를 주관한 화주의 소지이다. 예전에는 축문도 읽었지만 지금은 소지만 올린다.
샘제를 마친 풍물패와 마을 사람들은 흥겹게 풍물을 울리며 동화대가 서 있는 마을 입구로 향한다. 동화대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화주는 다시 제물을 차린다. 그동안에 풍물패들은 샘제를 지낼 때처럼 동화대 앞에서 풍물을 울리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제물을 모두 차려 놓았으면 잠시 풍물을 멈춘다. 동화제는 샘제보다 절차가 더욱 간소하다. 화주는 동화대 앞에 잔을 한 잔 올린 후 재배하고, 술잔을 들어 동화대 밑에 조금씩 나누어 세 번 붓는다. 이것으로 동화제는 끝이 나고 다시 풍물패들의 흥겨운 놀이가 시작된다.
구신마을 사람들은 샘제와 동화제를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풀이한다. 샘제를 모신 뒤 동화대를 불사르는 것은 이른바 수극화(水克火), 즉 물로써 불을 제압한다는 오행의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샘 앞 북쪽 방향에 제물을 차리고 샘제를 모신 후 근거리에 있는 남쪽 마당에서 동화제를 지낸다. 물이 나는 샘의 북쪽에서 샘제를 지내고, 남쪽에서 불을 질러 동화제를 지내야 순리라는 것이다. 이는 불의 기운을 눌러 화재를 예방하고 액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고에 비롯한 것이다. 이처럼 물과 불은 상극이지만 마을신앙에서는 부정을 씻는 정화(淨化)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황]
문신리 샘제·동화제는 최근까지도 계속 전승되고 있다. 과거에는 마을신앙의 차원에서 행하여졌다면, 최근에는 신앙 행위를 넘어서는 마을공동체의 문화 행사 및 축제로서 확장되고 있다.
- 강성복, 『부여 문신리 구신마을 샘제와 동화제』(부여문화원, 2011)
- 『부여의 무형문화유산』 (부여군, 2020)